<대전독서모임 산책의 5가지 질문>
1. 책 거의 첫 장에 나오는 ‘이순성’은 누구인가?
2. 40편의 짧은 소설로 구성된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를 읽은 소감(자유롭게)
3.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4.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은 삶이고, 나은 삶일까?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옷을 훌러덩 벗는다. 침대에 눕기전 방안의 불을 끈다. 새카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왼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어둠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멀티탭의 붉은 스위치. 그 불빛 하나를 움켜쥐고 침대에서 웅크린다. 몇 번을 뒤척이다 눈을 뜬다. 다시 천장을 응시하다보면 천장의 직사각형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눈이 어둠에 적응해 천장의 모서리와 책장이 희미한 선을 드러낸다. 벗어놓은 양말과 옷가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서서히 지워지고, 덩그러니 사람 모양의 '허전함'만 남는다.
이기호 작가의 짧은 소설 <불켜지는 순간들>을 읽다가 문득 이런 자취방의 풍경을 떠올렸다. 관계가 있다면 관계가 있고, 관련이 없다면 관련 없을 수도.
잠에 들기전 주문처럼 외우고 있진 않은지.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최면을 걸고 있는 건 아닌지.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 그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야하는 건 아닌지. 슬픔이든 눈물이든 기쁨이든 화든 꾹 눌러 참을 게 아니라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표출해야 되는 건 아닌지. 꾹꾹 눌러담는 말들, 감정들, 생각들. 이런 저런 푸념들. 숱한 바램들. 설레는 마음들. 서투른 표현들을.
나는 가끔은 어두운 극장에 홀로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변화하지 않고 있지 않나? 빠르게 변하는 영화 화면을 앞에 두고서. '인생'이라는 극장에서 부귀영화를 보고 싶기도 하다. 나는 어두운 공간에 푹 꺼져 있다. 홀로 밤을 뒤척이는 소리가 팝콘 부스럭 거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환청. 세계는 변화하고, 나는 홀로 극장에 죽은듯이 앉아 있는 것 같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나는 스쳐지나가는 욕망들을 아무런 생각없이 바라보고 있다. 15초 광고를 그저 바라보듯.
'독서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7 독서노트(27)이호신의 <숲을 그리는 마음> (0) | 2017.03.01 |
|---|---|
| 2017 독서노트(26)김훈의 <공터에서>, 밑줄 그은 문장 (0) | 2017.03.01 |
| 2017 독서노트(24)매거진 B-LEGO 편, 레고 용어는? (0) | 2017.02.01 |
| 2017 독서노트(23)희망의 발견: 시베리아의 숲에서 (0) | 2017.01.27 |
| 2017 독서노트(22)무인양품 디자인, 우리는 최대한 덜어낸다 (0) | 2017.01.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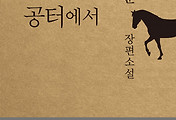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