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수많은 기사가 쏟아진다. 좋은 기사를 보면 한번 더 곱씹어 읽는다. 비슷한 제목과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을 보면 피로를 느낄 때도 있다. 그 수많은 기사의 홍수속에서 독자들도 정신 없을 것 같지만, 그 많은 기사를 하루에 쏟아내는 기자들도 정신 없을 것 같다.
기사를 읽다보면 참 좋은 기사도 있고, 나쁜 기사도 있고, 이상한 기사도 있다. 그리고 이걸 기사라고 쓴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와 이건 정말 잘 취재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언론을 혐오하게 된 것일까. 책<언론 혐오 사회>을 읽으면 그 답이 보인다.
대부분의 기자가 책상에 궁둥이 붙이고 기사를 쓰지만, 그들이 발로 뛰지 못하는 이유는 황당하게도 “시간이 없어서”다. 시간. 지금 언론이 가진 대부분 문제의 근원이자 기자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언론 문제의 본질은 단언컨대 기자들이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문제의 원인이 ‘구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기자 개개인이 정말 ‘빌런’이어서, 사명감도 없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에서 비롯된 차이일 수도 있다. 직장인이 된 기자의 게으름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 시간이 없으면 잠을 줄여서 취재하면 되지, 밥 먹을 시간 쪼개서 취재하면 되지, 이러면 사실 할 말은 없다.
그래도 굳이 하나의 원인을 꼽자면 구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기자가 출입처로 출근하고, 출입처에서 나오는 기사를 처리해야 한다. 아침에 기사를 보고하면 그 기사를 출고해야 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상황에도 대처해야 한다. 기사를 쓸 때는 남들보다 늦어서는 안 되며 남들보다 품질이 떨어져서도 안 된다.
‘일단 써’야 하고, 또 나오면 또 ‘일단 써’야 한다. 출입처에 출입하면 출입처 밖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 하루 호흡으로 기사를 쓰는 일간지, 주간의 호흡으로 기사를 쓰는 주간지, 한 달의 호흡으로 기사를 써야 하는 월간지······. 취재 시간이 길수록 기사의 품질은 좋아지지만 종이에 인쇄된 활자가 외면받는 이 시대, 월간지 시장은 처참하고 주간지 시장도 좋지 않다. 심지어 일간지 시장도 무너지는 중이며 이제 대부분의 언론은 초 단위 호흡으로 기사를 써야 하는 ‘온라인 매체’가 됐다.
기자들이 바쁘니 입체적인 취재는 불가능하다. 대충 편집회의에서 정해진 논조대로 미리 ‘기삿거리’를 정해놓고, 어떤 얘기를 할 줄 뻔히 아는 전문가들을 추린다. 그중에 내 기사 방향에 맞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얘기를 들으면 기사 하나 쓰는데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다.
- 밀리의 서재 책<언론 혐오 사회>-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 일단 정보의 독점이 불가능해졌다. 최근 관에서 생성하는 상당수의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다. 보도자료는 기자들에게만 공개되지 않고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굳이 기자가 아니어도 공무원과 접촉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도록 관의 전화번호는 모두 공개돼 있고, SNS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이 묻고, 관에서 직접 설명하고 있다. 국민이 자신의 알 권리를 언론에 위임하는 시대가 아니다.
또한 지금의 출입처 제도에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기사 업데이트가 초 단위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면서 확연히 드러났다. 어느 언론을 막론하고 기사가 다 똑같아지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모두 출입처 안에 있고, 만나는 사람도 같다. 그 말은 곧,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똑같다는 의미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는 그렇다 치고, 분석 기사도 똑같다. 출입처 안에서는 똑같은 사람의 핸드폰만 기자들의 전화로 불이 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한정적이다. 그러니 당연히 똑같은 기사만 나오는 것이다.
더욱이 초 단위 기사 업데이트가 이뤄지면서, 데스크는 기자들이 출입처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확보해내길 바란다. 하지만 이건 한두 명의 출입기자로는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일종의 ‘길드’를 형성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기사 작성 시점을 조율한다. 이쯤 되면 안 똑같은 것이 이상한 것이다.
- 밀리의 서재 책<언론 혐오 사회>-
기자들은 무력했지만 그래도 언론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이 그 무력함 때문은 아니었다. 언론인들이 배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고, 산소통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 실종자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실종자 가족이나 국민이 언론을 혐오했던 것이 아니다.
언론은 엉망진창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저열하고 무책임했다는 것이다. 실종자들의 행방을 알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언론 중 하나라는 MBC는 실종자 가족들이 가족이 사망한다면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보도했다. 인터넷 포털에서는 세월호 침몰과 영화 타이타닉을 비교하는 기사가 나왔고, SK텔레콤이 실종자 가족에게 긴급 구호품을 보내기로 했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잘 생겼다~’는 SKT의 CM송 가사를 제목에 넣었다.
사망한 아이들의 책상 서랍을 뒤져 기사를 쓴 기자도 있었고, SBS와 KBS는 홀로 구조된 여섯 살 아이에게 부모의 행방을 묻는 인터뷰를 했다. 단원고에 죽치고 있던 기자들은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학교에 버렸다. 저널리즘은 ‘기삿거리’ 앞에 나뒹굴고, 언론은 돈과 윤리 앞에서 망설임 없이 돈을 선택했다. 그 배신감에 실종자 가족들과 많은 국민이 치를 떨었다.
- 밀리의 서재 책<언론 혐오 사회>-
엠바고 파기와 관련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일례가 ‘제미니호 사건’이다. 지난 2011년 4월, 한국인 선원들이 타고 있던 싱가포르 국적의 선박 ‘제미니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되었다. 4명의 국민이 해적에 잡혀 있는데 우리 국민은 그 소식을 무려 16개월간 몰랐다. 외교통상부가 엠바고를 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엠바고만 걸어놨을 뿐,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협상에 적극적이지도 않았다. 결국 외교통상부에 출입하지 않는 미디어오늘과 시사인이 엠바고를 깼고, 이후 여론에 떠밀려 정부가 적극 협상에 나섰으며 4개월 만에 피랍된 국민이 풀려났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은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엠바고가 걸려 있다는 이유로 제미니호 선원들이 피랍된 사실을 알고도 보도하지 않았고, 왜 구출하지 않냐고 더 묻지도 않았다. 정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인가? 이런 엠바고를 지켜야 할까?
- 밀리의 서재 책<언론 혐오 사회>-
SNS와 커뮤니티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도구다. 언론도 SNS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화소 높은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이 시대에, 1보 뉴스와 속보가 개인 SNS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도 많다.
또 SNS에도 커뮤니티에도 뉴스는 있다. 30년 독재자 무바라크를 몰아낸 이집트 혁명 당시, 세계 언론은 이집트 시민들이 쏟아낸 트위터를 보고 뉴스를 썼다. SNS, 커뮤니티 발 뉴스의 순기능도 있다. 고사리손으로 모은 저금통을 기부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커뮤니티를 통해 언론을 타고 전국 곳곳에 온기를 전하고, 돈이 없어 피자 주문을 망설이던 아이의 아빠에게 피자를 보내준 마음 착한 청년의 가게는 커뮤니티와 언론을 타고 ‘돈쭐’이 났다.
뉴스를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얻어내는 것도 능력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다. 똑같이 SNS나 커뮤니티에서 뉴스를 만들어도, PV나 벌어보려는 얄팍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공익을 고려한 뉴스 선택이냐에 따라 기레기냐 기자님이냐가 나뉘는 것 아닐까?
- 밀리의 서재 책<언론 혐오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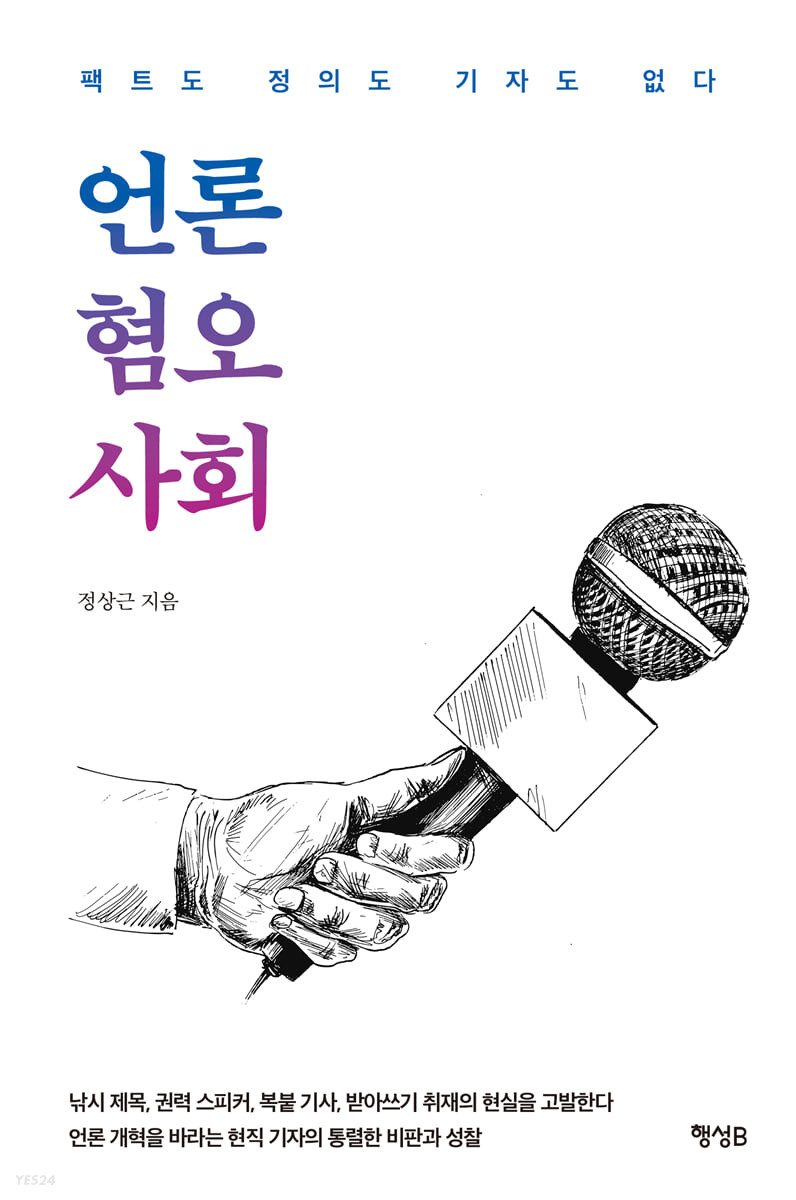
'독서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독서노트(638)무인양품, 무지그램, 딕 포스베리, 박찬욱, 윤종신, 박진영 (0) | 2022.09.30 |
|---|---|
| 독서노트(637)이백의 행로난 (0) | 2022.09.29 |
| 독서노트(635)외로움, 이석원 소품집 (0) | 2022.09.25 |
| 독서노트(634)신서유기 (0) | 2022.09.24 |
| 독서노트(633)인간의 모든 죽음 (0) | 2022.09.23 |




댓글